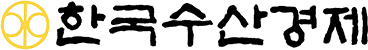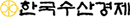-모르는 것은 쥐어줘도 모른다(掌授不知)
옛날 어느 집에서 일곱 살 먹은 처녀를 민며느리로 맞아들였다.
어느덧 수삼 년의 세월이 흘러 며느리가 열 서너 살에 접어들자 이제는 음양의 이치를 알 때도 됐다고 여긴 시부모가 성급하게 며느리를 아들의 방에 들여보내
동침을 하도록 했다. 장성한 아들이 어린 처가 혹시 음양을 아는가 싶어 자기 양물(陽物)을 처의 손에 쥐어 줘 보았다.
며느리는 뭔지는 모르나 보드라운 촉감이 좋고 기분이 이상해 남편의 양물을 조물락거렸더니 금새 부풀어올라 손바닥 안이 그득해져 꼭 터질 것만 같았다.
덜컥 겁이 난 며느리가 얼른 잡았던 남편의 양물을 놓고 시부모의 방문 앞에 가서,
"아버님, 어머님!"
하고 황급히 부르자 방안에서,
"왜 그러느냐 ?"
"서방님이 가죽방망이를 손에 쥐어 주는 데 붙들고 있었더니 자꾸 커져 가지고 밤새도록 놔두면 한방 가득 넘칠 것 같습니다."
어린 며느리의 이 말에 시어머니 장탄식을 하며,
"모르는 것은 쥐어 줘도 모른다더니 네가 바로 그짝이로구나!“
-한맺힌 두견새 울음소리 (杜鵑恨聲)
북한산 아래의 어느 마을에 여인네 셋이 모여 앉아 길쌈을 하는데 밤이 으슥해지자 두견새(소쩍새)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하품을 하던 한 여인이 일손을 놓고,
"우리 심심한데 남정네들이 기생집에서 하는 것처럼 두견새 울음소리로 시를 지어 봅시다."
하고 제안을 하자 마침 무료하던 차에 잘됐다며 두 여인네도 반겼다.
한 여인이 먼저,
'禽言恨蜀小(금언한촉소)' 한맺힌 두견새 소리가 촉소 촉소
라고 지었다.
왜 촉소(蜀小)라고 지었느냐고 물으니,
"옛날에 촉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너무 작고 힘이 없어 망하는 바람에
그것을 한탄하여 두견새가 '촉소 촉소' 하고 울었지요." 라고 했다.
두 번째 여인이,
"뭘 옛날 고사(故事)까지 들먹이며 글을 짓는가요?
나는 '禽言恨鼎小(금언한정소)'로 지었지요.
우리집 솥이 작으니 두견새가 '솥적다. 솥적다' 하고 우는 것 같지 않아요?"
라고 하였다.
가만히 듣고 있던 세 번째 여인이 무릎을 탁 치며,
"나는 '禽言恨陽小(금언한양소)'로 지었어요.
우리집 서방님의 양물(陽物)이 작으니 이를 알아챈 저 두견새가 '좆작다, 좆작다' 하는 소리로 우는 것 같지 않은가요?"
하더란다.
-군자는 몸에서 옥을 떼어놓지 않는다 (君子不玉去身)
중종(中宗)조의 문신(文臣)이요 학자인 박순(朴淳)은 거동과 용모가 아름답고 신선 같았으며 성품 또한 청렴하고 결백하였지만 여종 범하는 것을 지나치게 좋아하여 밤만 되면 여종의 방을 드나들었다.
부인이 시집을 올 때 데리고 온 옥(玉)이라는 여종이 있었는데 생김새가 지극히 추한지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지만 유독 박순만이 그녀를 범하였다.
혹자(或者)가 그 사실에 대해 비난하자 박순이 웃으면서 말했다.
"저 아이는 진실로 가련하오. 내가 아니라면 누가 추물인 그 애를 가까이 해주겠소?'
박순의 장인이 출가한 딸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는 날 박순은 부인을 친정에 보내지 않았으며 땅문서도 받지 않았다.
박순의 벗이 이 일을 전해 듣고 희롱하여 말했다.
"공(公)은 처가의 재물에 대해서는 이처럼 결백하면서, 유독 처가에서 보내온 옥이라는 여종만은 끔찍이 가까이 하는 연유(緣由)가 무엇인가?"
그러자 박순이 성난 목소리로 말하였다.
"자네는 예기(禮記)도 읽지 않았는가? 군자는 몸에서 옥을 떼어놓지 않는 것(君子不玉去身)이 바른 몸가짐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는 것일세."
이 말을 듣고 한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껄껄 소리내어 웃었더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