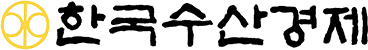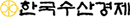- 모르는 것은 쥐어줘도 모른다 (掌授不知)
옛날 어느 집에서 일곱 살 먹은 처녀를 민며느리로 맞아들였다. 어느덧 수삼 년의 세월이 흘러 며느리가 열 서너 살에 접어들자 이제는 음양의 이치를 알 때도 됐다고 여긴 시부모가 성급하게 며느리를 아들의 방에 들여보내 동침을 하도록 했다.
장성한 아들이 어린 처가 혹시 음양을 아는가 싶어서 자기 양물(陽物)을 처의 손에다 쥐어 줘 보았다.
며느리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보드라운 촉감이 좋고 기분이 이상해 남편의 양물을 조물락거렸더니 금새 부풀어올라 손바닥 안이 그득해져 꼭 터질 것만 같았다.
덜컥 겁이 난 며느리가 얼른 잡았던 남편의 양물을 놓고 시부모의 방문 앞에 가서,
"아버님, 어머님!"
하고 황급히 부르자 방안에서,
"왜 그러느냐 ?"
"서방님이 가죽방망이를 손에 쥐어 주는데 붙들고 있었더니 자꾸 커져 가지고 밤새도록 놔두면 한방 가득 넘칠 것 같습니다."
어린 며느리의 이 말에 시어머니 장탄식을 하며,
"모르는 것은 쥐어 줘도 모른다더니 네가 바로 그짝이로구나 !"
하였더라 한다.
- 배가 불러 도망치다 (苦飽還逃)
노씨 성을 가진 한 선비가 젊었을 때부터 기상이 호탕하고 놀기를 매우 좋아했다. 한번은 호남 지역으로 유람하여 한 고을에 이르니, 관장이 나이가 예순이 넘은 기생을 하나 붙여 주면서, 나이는 좀 많지만 왕년에 명창으로 크게 이름을 떨쳤던 기생이라고 소개를 하는 것이었다.
이에 선비가 옆에 와 있는 기생을 살펴보니 머리는 손질하지 않아 봉발(蓬髮)이었고, 살갗은 까칠하게 퇴화되어 계피(鷄皮) 같았다.
그래도 옛날에 이름을 날렸다니까 함께 자기로 하고 그 기생을 부르니, 옷은 길게 입어 거친 피부를 가리고 입에는 천초1)를 머금어 냄새를 숨기는 등 온갖 치장을 하고 들어왔다.
1)천초(川椒 ): 조피나무 열매 껍질로 약재로 쓰이며 향기가 있다.
선비는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한때 유명했다는 말에 호기심을 느껴, 기생과 함께 옷을 벗고 잠자리 행사를 시작했다.
그랬더니 기생은 어린 아이처럼 좋아하면서 능란한 솜씨로, 마치 젊은 소년이 혼인하여 사랑놀이를 하듯 몸에 안기면서 보채고 애교를 부려 움직임에 대응해 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날이 밝자 노기(老妓)는 관아에서 마련해 주는 음식을 거절하고 자신이 몸소 장만한 서른여 가지의 음식을 들여왔는데, 온갖 산해진미가 즐비했다.
아침 식사가 끝나도 음식을 끊임없이 들여와, 하루 여섯 차례에 걸쳐 진수성찬으로 올리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배가 불러 사양하면 상머리에 붙어 앉아 떠나지 못하게 하고는 숟가락으로 떠먹이며 계속 권하니, 선비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다.
곧 선비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겠다고 하니, 기생은 화를 내고 발악을 하면서 붙잡아 떠날 수도 없었다. 이에 선비는 새벽에 가만히 종을 불러 떠날 채비를 갖추고 대기하라 일러 놓고는, 아침식사 뒤 측간(厠間)에 다녀오겠다면서 간신히 빠져나와 말을 타고 쏜살같이 떠나 버렸다.
아전들이 선비가 떠난 사실과 연유를 고하니 관장은,
"옛날 중국 전국시대에 문객(文客)을 3천 명이나 거느리고 있었다는 맹상군(孟嘗君)도, 식객이 배가 불러 견디지 못하고 도망쳤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지금 내 손님은 배가 불러 죽겠다고 도망을 쳤으니 분명 맹상군보다 내가 낫구먼."
하고 말하면서 손뼉을 치면서 웃었다 한다.
- 과부에게 써 준 글자 (立字題辭)
한 시골에 남편이 죽고 자녀들도 없이 혼자 어렵게 살고 있는 과부가 있었다.
곧 가을철에 초가지붕을 새로 이어야 하는데, 자신이 농사지은 짚으로는 도저히
집 전체를 덮을 만한 양이 못 되었다. 그러자 근처에 사는 한 선비 집으로 가서,
"선비어른! 농사를 적게 지어 밥은 굶지 않고 먹겠사오나, 짚이 모자라 지붕을 덮을 수가 없습니다. 좀 도와 주십시오."
하고 간곡하게 청을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선비가 순순히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해 보냈다.
이 때 마침 멀리 사는 친구가 선비를 방문하여 같이 있다가, 이 모습을 보고는 웃으면서 말했다.
"이 사람아! 뒤에 과부 집으로 짚을 보내 줄 때는'설 립(立)'자를 한 자 써서 함께 보내는 것이 좋을 걸세."
"그게 무슨 뜻인고? '설 립(立)'자를 왜 써서 보내라고 하는가?"
"옛날에 말일세. 한 관장이 순시를 하다가, 뾰족하게 높이 선 바위를 보고는 그 앞에 재물을 차리고 소원을 빌고 난 뒤, 그 바위에 '설 립(立)'자를 한 자 커다랗게 새겼다네."
"그렇다면 그 관장이 소원하는 바가 거기 새겨진 '설 립(立)'자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로군. 그렇지 않은가?"
"맞았네. 이 '설 립(立)'자는 말일세. '논어'에 나오는 '삼십이립(三十而立)'이라고 한 그 '립(立)'자란 말일세.
공자가 15세에 학문에 뜻을 두었고, 30세에 자립(自立)하여 흔들림 없이 굳건해졌다는 그 뜻과 같은 의미를 지녔다네."
"그렇다면 내가 과부 집에 짚을 보내 주면서 왜 그 '설 립(立)'자를 써서 준단 말인가? 공자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에 친구는 한참 동안 웃더니 설명을 했다.
"그 '30에 선다'는 말은, 남자의 양근(陽根)이 한 달 30일 동안 날마다 잘 선다는 뜻이라네. 그러니 과부를 보면, 한 달 내내 자네의 그 연장이 잘 설 게 아니겠는가? 앞서 그 관장이 뾰족한 바위에 '설 립(立)자를 새기면서 소원을 빈 것도
마찬가지의 뜻이었다네.'
이에 비로소 선비는 뜻을 알고 함께 웃었다.
그리고 뒤에 종을 시켜 과부 집에 짚을 보낼 때, '설 립(立)'자를 커다랗게 써서 함께 보내 주었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