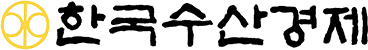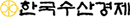순간 선비는 안간힘을 다하여 여인을 밀쳐내고 스스로를 꾸짖었다.
아서라, 선비의 도리가 아니느니라.
당황한 여인은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다.
“선비님, 너무 하시옵니다. 흑∼흑∼흑∼.”
봉긋한 젖무덤까지 풀어헤쳤던 여인이 떨리는 손으로 옷고름을 여미며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지게문 사이로 흘러들어 오는 달빛이 여인의 어깨 위에 부서지며 흘러내린다.
댓잎에 스치던 밤바람이 일렁이며 툭 하고 밤송이 구르는 소리가 들리건만 여인의 어깨 위에 일렁이던 파도는 멈추지 않았다.
여인의 처연한 모습을 바라보는 선비는 난감했다.
“ 주안상을 물리고 지필묵을 들여라”
주안상을 치우고 붓과 벼루와 청잣빛 영롱한 연적을 받쳐 들고 들어온 여인은 종이를 가져오지 않았다.
선비가 눈빛으로 화선지를 찾자 여인은 말없이 갑사 치마끈을 풀어 선비 앞에 펼쳐놓았다.
벼루에 먹을 갈던 여인의 눈가에 이슬이 맺히더니 벼루에 떨어졌다.
흐느낌을 감추려는 듯 여인의 손놀림이 빨라졌다.
거울에 비친 꽃이요 물위에 떠 있는 달이로다(鏡花水月)
이튿날, 일필휘지(一筆揮之)로 써 내린 휘호를 치마에 남겨두고 동창이 밝을 무렵 주막집을 나선 선비는 장평 진부를 지나 아흔아홉 굽이 대관령을 넘어 해질 무렵에 처가에 도착하였다.
얼마 만에 찾은 처가인가?
7년 전 떠나올 때 마당에 심은 배롱나무가 몰라보게 자랐지만 아내의 모습은 새색시 그대로 고왔다.
한 달을 처가에 머물며 쌓였던 회포도 풀고 아내와 운우의 정을 나눈 선비는 과거시험 때문에 다시 처가를 떠나 한양으로 길을 떠났다.
대관령 굽이굽이 고갯길을 터벅터벅 걸어 내려오던 선비는 날이 저물자 주막집 그 여인이 자꾸만 생각났다.
다른 주막에서 묵을 수도 있지만 다시 대화 그 주막을 찾아들었다.
“지나는 길손에게 그런 당돌한 청을 한 연유가 무었이더냐?”
주안상을 마주 놓고 여인에게 물었다.
“비록 배운 것은 없어 주막을 열어 먹고사는 무지렁이이오나 사람의 기색을 살필 줄 아옵니다 ”
“기색이라…? 그래, 내 기색이 어떻더냐?”
“그날 선비님의 안색에 서기가 서린 것을 보고 귀한 자식 하나 얻어 볼까 하는 마음에 아녀자로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리하였습니다”
“오호, 그랬었구나 . 그렇다면 오늘밤에 이루지 못한 운우의 정을 풀어보자꾸나”
이래서 남자는 도둑놈이라 하는가?
진정으로 원할 때는 거절하더니 처가에서 아내와 실컷 배꼽을 맞추고선 식사 후에 숭늉 챙겨먹는 식으로 들이대니 이런 고얀 일이 있는고
“지금은 아니 되옵니다. 그때는 선비님의 안색에 서기가 넘쳐났으나 지금은 그 서기가 사라졌을 뿐 아니오라 이미 부인의 몸에 귀한 아드님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미천한 계집이 몸만 더럽힐까 두렵습니다. ”
여인의 표정은 싸늘했다 선비는 정신이 바짝 들며 싸하게 퍼지던 술기운까지 확 달아났다
“선비님은 아들을 얻을 것이온데 아이는 인시에 태어날 것이며 일곱 살에 호환이 두렵사옵니다 ”
다소곳이 치마폭에 무릎을 접은 여인의 입에서 예사롭지 않은 말이 튀어나온다.
사람을 현혹하는 무기(誣欺)인가?
하늘의 뜻을 흘리는 천기누설(天氣漏泄)인가?
정신이 바짝 든 선비는 지금까지의 무례를 사과하고 호환을 막을 방도를 물었다.
호환(虎患)이 무엇인가?
애 어른 할 것 없이 호랑이에게 물려가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무서운 일로, 특히 사대부가에서는 치욕으로 여겼다.
조상을 소홀히 모시는 집안에 호환이 든다는 속설이 있었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호랑이 물어갈 놈’이라는 욕까지 나왔겠는가.
“1000그루의 밤나무를 심으면 화를 면할 것입니다. 또 아이가 일곱 살 되던 해 낯모르는 스님이 찾아와 아이를 보자 하거든 절대 보여주지 말고 밤나무를 보여주소서 ”
한양에 도착한 선비는 밤나무를 심으라는 그 여인의 말이 머리를 맴돌아 공부가 되지 않았다.
밤나무가 무엇인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밤나무는 죽어서 신주(神主)가 된다.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하는 신성한 나무이기에 밤나무를 심는 것은 덕을 쌓는 것이다.
율곡 이이가 태어난 오죽헌 몽룡실 과거 공부하던 선비는 고향 마을에 1000그루의 밤나무를 정성들여 심었다.
강릉에 있던 아내도 파주에 와 있고 사내아이가 일곱 살 되던 어느 날 대화 주막집 여인의 말대로 금강산 유점사에서 왔다는 노스님이 갈포 장삼에 굴갓을 쓰고 찾아왔다.
“이 고을에 나라의 재목이 될 아이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소이다”
아이를 보자고 했다.
“내 아이에게 손대지 마시오”
선비가 소리를 지르며 밤나무를 가리켰다.
그러자 노스님이 밤나무를 세고 있지 않은가.
하나, 둘, 셋…. 이렇게 헤아리던 밤나무 숫자가 999에서 멈췄다.
소를 매놨던 밤나무 한 그루가 그만 말라 죽어가고 있었다.
“천명을 거역하려는 것이오?”
진노한 노스님이 하얗게 흘러내린 수염을 쓰다듬으며 호통을 쳤다.
“나도 밤나무….”
소리치며 나서는 산밤나무가 있었다.
이 소리를 들은 노스님이 하얀 수염을 휘날리며 바람처럼 사라져버렸다.
이렇게 호환을 면한 아이가 조선시대 대학자 율곡이며 선비는 율곡의 아버지 이원수이다.
저작권자 © 한국수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