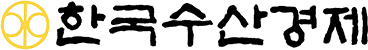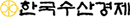G1
기생의 평가부안(扶安) 기생 계월(桂月)이 시 읊기를 잘하고 노래와 거문고에 능하였다. 그는 스스로 매창(梅窓)이라 호(號)를 짓고 뽑혀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다. 수재와 귀공자들이 모두 다투어 먼저 맞이하여 시를 수창(酬唱)하고 논평하였다.
어느 날의 일이었다. 유(柳)라는 선비가 그를 찾았을 때, 김(金)․최(崔) 두 사람이 먼저 자리에 앉았는데 둘은 모두 내노라 하는 오입장이로 자부하였다. 계월이 술자리를 벌여 그들을 접대하였다. 술이 반쯤 취하자 셋이 서로 계월을 독점하려는 기색이 나타나는 것이다. 계월은 웃으면서,
“당신들이 각기 풍류장시(風流場詩)를 외어 한 차례 기쁨을 뽑는 것이 어떨까요. 만일에 제 마음에 드는 아름다운 글귀가 있다면 오늘 저녁에 모시기로 하리다. 먼저 천기(賤妓)들의 전통(傳誦)하는 시를 외어 드리리다.”
하고 다음과 같은 두 절의 시를 읊는 것이었다.
옥도곤 흰 팔은 여러 사내 베개요,
붉은 그 입술은 여러 손님 맛 보았소.
네 몸이 보아하니 서릿날이 아니어늘
어이하여 나의 애를 끊고 가는 거요.
삼경 밝은 달엔 발굽이 춤을 추고
일진(一陣) 바람결에 이불이 펄렁이네
이때를 당하여 무한한 그 맛은
오직 두 사람만이 함께 누릴 것이오.
그들 세 사람은 모두 응낙하였다. 김이 먼저 칠언절귀(七言絶句) 한 수를 읊었다.
창 밖 삼경에 가는 비 내릴 제
두 사람 그 마음을 둘이서만 아오리다.
새 정이 흡족하잖아 날이 장차 새려 하니
다시금 소매 잡아 뒷 기약을 물었소.
최가 그 뒤를 이어서 불렀다.
껴안고 사창(紗窓)을 향해 쉬지 못할 그 일에
반은 교태 머금은 채 반은 부끄럼을 짓는구나.
낮은 소리 물어 오되 나를 생각하려나요
금채(金釵)를 다시 꽂고 웃으며 머리 끄덕.
계월은 웃으면서 비평하기를,
“앞의 것은 너무나 옹졸하고, 뒤의 것은 약간 묘하긴 하나, 수법이 모두 낮으니 족히 듣잘 것이 없겠소. 대체 칠언절귀는 비교적 쉽지만 율시는 더욱 어려우니, 저는 그 어려운 것을 취하려 합니다”
하니 김이 먼저 물렀다.
아리따운 그 아가씨 나이는 겨우 열 다섯에
온 서울에 이름 가득 노래 불러 제일이라.
오입장이 맺은 정은 가득 바다보다 깊어 있고
화관(花官)의 엄한 영은 서리처럼 싸늘하이.
난초 창 다사로와 아침 단장 재촉하고
솔고개 바람 높자 저녁 걸음 바빴었소.
이별할 땐 많건마는 만나기 어려우니
양대의 비구름이 초양왕(楚襄王)을 괴롭히네.
이 시를 본 최는,
“이 시가 비록 아름답다 하나, 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지 않아”
하고,
강머리에 말 세운 채 이별 짐짓 더디어라.
양유 가장 긴 가지가 나는 몹시 미움고녀
가인은 인연 엷어 새 교태 머금고
오입장이 정이 많아 뒷 기약을 묻는고나.
도리 꽃이 떨어지니 한식절이 다가오고
자고(鷓鴣)새 날아가니 석양이 비낄 때라.
남포에 풀이 많고 봄 물결이 넓을 제
마름꽃을 캐려다가 생각한 바 있었다오.
라고 읊었다. 이 시를 보고 계월은,
“이 시는 약간의 맑은 운치가 있으나, 족히 사람을 움직일 수 없겠소.”
하고는 유를 돌아보면서 이르기를,
“당신은 홀로 시를 읊을 줄 모르시오?”
“난 애초부터 글이 짧고 옛날 양구가 크기로 이름 높던 오독(嫪毒)의 수레바퀴를 궤던 재주가 있을 뿐이오”
하는 것이었다. 계월은 웃으면서 답하지 않는다. 최가 화를 내면서 이르기를,
“오늘엔 의당히 시의 잘잘못을 논할 것이 아니야!”
하매, 이 말을 들은 김은 자부하는 빛이 있어 읊기를,
가을 밤 새기 쉬우니 길단 말을 하지 마오.
등불 앞에 다가앉아 비단 치마 풀어 보렴.
외눈이 열리니 감은 동자 반짝이고
두 가슴 합해지니 땀 냄새도 향기로와
다리는 청구머리 물결에 헤엄치고
허리는 잠자리라 물에 바삐 잠기더군.
강건하기 짝이 없음 마음에 자부하기
사랑 뿌리 깊고 얕음 임에게 묻노매라.
계월이 이 시를 듣고는 잘되었음을 칭찬하는 것이었다. 그제야 유는 계월로 하여금 운자를 부르라 하고 운자가 떨어지자 다음과 같이 읊었었다.
봄빛 찾은 호탕한 선비 기운도 높을시고
비취(翡翠) 이불 속에 아름다운 인연 있어
옥 팔뚝을 버티니 두 다리가 우뚝하고
붉은 구멍 꿰뚫으니 두줄이 둥글고나.
눈매를 처음 볼 제 아득하기 안개같고
장천을 쳐다보니 돈보다 작아지네.
그 속에 별재미를 만약에 논하려면
하룻밤 높은 값이 천금이 되오리라.
계월이, 이 시를 듣고 나서 탄식하기를,
“이는 운자가 떨어지자 곧 부른 것이었으나 침석(枕席) 사이의 정태를 잘 형용하였을 뿐 아니라, 글이 극도로 호방(豪放)하고 웅건하니, 반드시 범상한 재주가 아니오니 원컨대 존어(尊御)를 듣고자 합니다.”
하는 것이었다. 유는,
“나는 곧 유모(柳某)라는 선비요.”
하고 대답을 하였더니 계월은,
“존공(尊公)께서 이런 누추한 곳에 왕림하실 줄을 몰랐소이다. 이제 다행히 만나 뵈는군요”』
하고 이내 잔을 드리고 웃으면서 이르기를,
“만일에 온 하늘로 하여금 작은 돈짝과 같이 한다면 그 값이 다만 천금에 그칠 것입니까?”
하고 또 두 선비를 향하여 이르기를,
“당신에의 읊은 바는 한 잔의 청량음료만도 못하구료.”
하고 핀잔을 주는 것이었다. 최․김은 모두 묵묵히 물러가 버렸다. 유는 드디어 뜻을 얻어 함께 그 밤을 세웠다.
저작권자 © 한국수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